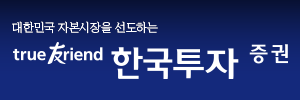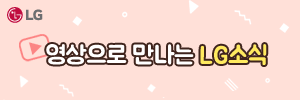“AI 슈퍼스타, 수천억원 주고 영입하면 정말 효과 있나”
이코노미스트, “지식이 핵심이고 인재의 영향이 엄청나게 커, 팀단위 이동이 바람직”
인공지능(AI)업계에서, 메타가 시작한 AI인재 영입전쟁이 가열되고 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인재의 이직 효과는 불확실하다”면서 “내부 승진자가 외부 채용자보다 성과가 나은 경우가 많고, 스타 때문에 기존 조직의 성과가 저하되는 경우도 다수”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코노미스트는 “하지만, AI 분야는 예외적일 수 있다”며 “소수 인재가 큰 효과를 낼 수 있고, 기존 직원이 적어 조직 충돌 우려도 적다”고 최근 제기했다.
현재 글로벌 AI업계에서는 세계 최고의 인재를 둘러싼 경쟁이 극심하다. 메타의 최고경영자(CEO)인 마크 저커버그는 ‘초지능(superintelligence)’ 연구소를 위한 인재 채용을 직접 지휘하고 나섰다.
그가 제시하는 금액은 상상을 초월한다. 애플의 AI 모델 책임자를 데려오기 위해 2억 달러(약 2749억 2000만 원) 이상을 제시했다고 한다. 오픈AI 경영진은 저커버그의 공격적인 스카우트에 대응하기 위해, “보상 체계를 재조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초고액 스카우트가 정말 의미 있으려면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했다. 이는 바로, 인재가 ‘이식이 가능하다(portable)’라는 믿음, 즉 슈퍼스타가 조직을 옮겨도 여전히 빛을 발할 수 있다는 확신이다.
하지만 이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평균적으로 내부 승진자는, 외부 채용자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기 때문이다. 내부 인사는 누구에게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로그인 문제 같은 기본 절차도 이미 숙지하고 있다. 이런 단순한 문제를 슈퍼스타라면 금세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더 근본적인 문제는 성과가 단순히 개인의 탁월함에만 의존하지는 않는다는 점. 탁월한 성과는 △사람과의 관계, △조직문화, △일하는 방식, △암묵적 지식 등 해당 인물을 둘러싼 ‘맥락’과 뗄 수 없이 얽혀 있다.
이러한 ‘기업의 특정한 요인들(firm-specific factors)’이 성과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분석한 연구들을 이코노미스트는 제시했다. 하버드비즈니스스쿨의 보리스 그로이스버그는 린다 엘링 리, 아시시 난다와 함께, 외부 평가에서 상위권에 오른 투자분석가들이 이직 후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연구했다.
이론적으로는 이들 투자분석가가 회사를 옮겨도 성과에 큰 변화가 없어야 한다. 분석가들은 기존처럼 같은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같은 고객을 상대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직한 스타들’의 성과가 ‘회사를 떠나지 않은 동료들’의 그것보다 낮았다.
영국 요크대의 클라우디아 가비오네타 등도, 2000~2017년 사이 영국의 로펌을 대상으로 분석해 비슷한 결과를 내놨다. 스타 변호사를 영입한 부서는 다음 해 평균적으로 성과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타가 기존 팀원들의 퍼포먼스를 방해하기 때문일 수 있다.
스페인 비즈니스스쿨 에사데(ESADE)의 마테오 프라토, 그리고 아에세(IESE)의 파브리치오 페라로는 증권 애널리스트의 이직 사례를 분석했다. 결과를 보면, 기존 팀원의 성과가 저하됐다. 특히 하위 등급 애널리스트들에게서 그 영향이 컸다. 이는, 자원이 슈퍼스타에게 집중되면서 다른 직원들의 기회가 줄었기 때문일 수 있다.
다만 직무의 성격에 따라 차이는 존재한다고 이코노미스트는 덧붙였다. 그로이스버그의 다른 공동연구는, 미식축구(NFL) 선수의 이직 효과를 분석했다. 전술에 따라 복잡한 움직임이 필요한 와이드 리시버는 이직 시 성과가 떨어졌다. 하지만, 팀과의 협업이 거의 필요 없는 펀터(kicker)는 이직해도 성과에 큰 차이가 없었다. 즉, 순전히 개인 역량에 기반한 직무일수록, 이직 후에도 성과가 유지되기 쉽다는 것이다.
반대로, 높은 성과가 팀의 협업 결과라면 전체 팀을 함께 이동시키는 것이 해법일 수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설명했다. 실제로 분석가들이 팀 단위로 이직했을 때, 성과 하락은 크지 않았다. 개인의 성향도 중요하다. 코넬대의 레베카 키호와 드렉셀대의 다니엘 차바르는, 미국 바이오테크 기업에서 협업 지향적인 슈퍼스타가 팀원들의 생산성을 오히려 높여준다는 연구를 발표했다.
AI 분야에서는 슈퍼스타 전략이 더 적합할 수 있다. 이 분야는 최첨단 지식이 핵심이며, 소수의 인재가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기존 직원이 적기 때문에 실망시킬 인원도 적다. 또, 이직하는 슈퍼스타가 더 성과 좋은 조직으로 이동할 경우, 기존의 조직 지식이나 관계를 상쇄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다. 결국, 슈퍼스타에게 돈을 쏟아부어 따라잡으려는 전략은 큰 도박일 수 있다는 뜻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밝혔다.
권세인 기자
[ⓒ데이터저널리즘의 중심 데이터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